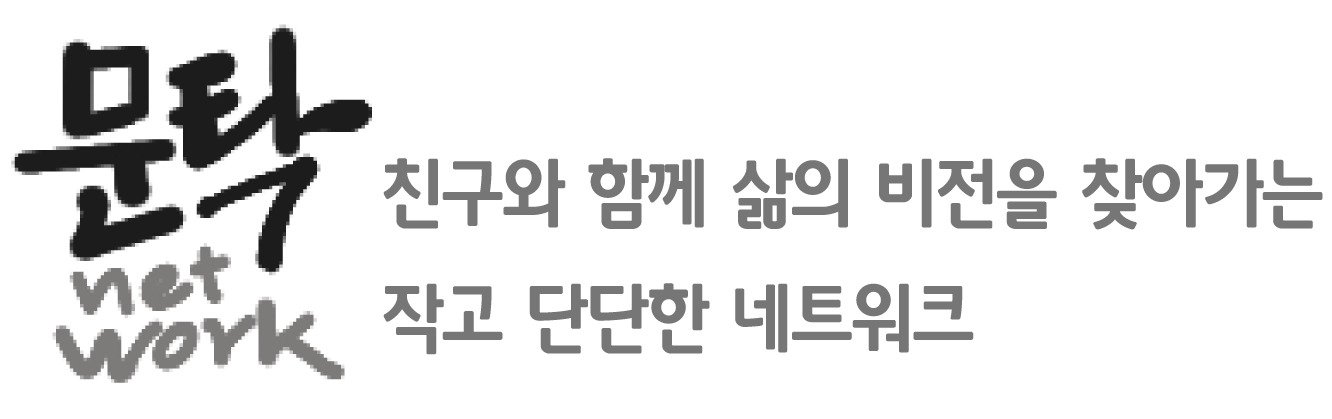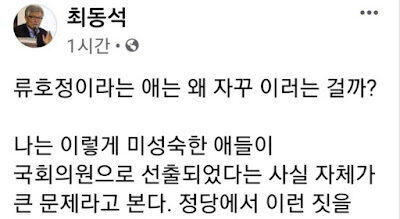세미나 에세이 아카이브
소녀를 구하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서 다닌 첫 직장은 성폭력상담소 부설 청소녀 쉼터였다. 성폭력 피해 10대,20대 청소녀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쉼터의 간사로 활동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해 먹고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일이었다. 90%가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었고, 유산 경험이 있으며, 어릴 때부터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지능이 발달하지 못해 지적발달장애를 가졌고,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받는 딸아이를 외면하는 친모를 가진, 청소녀들이, 거기 있었다. 그 때부터 성(性)에 관심이 높아졌다. 성폭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이 무엇인지, 성차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 즘 레즈비언과 게이를 알게 되었고 트랜스젠더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페미니즘을 배웠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페미니즘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다.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었다. 남성보다 차별받는 여성이 좀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친구, 레즈비언 ‘여성’이 좀 더 잘 사는 세상이 궁금했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아카데미에 참여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예술분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많은 레즈비언을 만났다. 울퉁불퉁하게 생겼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대화가 잘 되었고 유쾌했으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벽장 속에 갇혀 있어 커밍아웃을 하지 못했으며 아웃팅 당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말하는 그들과 나는...
소녀를 구하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서 다닌 첫 직장은 성폭력상담소 부설 청소녀 쉼터였다. 성폭력 피해 10대,20대 청소녀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쉼터의 간사로 활동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해 먹고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일이었다. 90%가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었고, 유산 경험이 있으며, 어릴 때부터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지능이 발달하지 못해 지적발달장애를 가졌고,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받는 딸아이를 외면하는 친모를 가진, 청소녀들이, 거기 있었다. 그 때부터 성(性)에 관심이 높아졌다. 성폭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이 무엇인지, 성차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 즘 레즈비언과 게이를 알게 되었고 트랜스젠더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페미니즘을 배웠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페미니즘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다.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었다. 남성보다 차별받는 여성이 좀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친구, 레즈비언 ‘여성’이 좀 더 잘 사는 세상이 궁금했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여성단체에서 실시한 아카데미에 참여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예술분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많은 레즈비언을 만났다. 울퉁불퉁하게 생겼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대화가 잘 되었고 유쾌했으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벽장 속에 갇혀 있어 커밍아웃을 하지 못했으며 아웃팅 당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말하는 그들과 나는...

세미나 에세이 아카이브
1. 정체화된 페미니즘의 현장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긍정적인 지지를 보냈다. 페미니즘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조금 더 나에 가깝게 설명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동안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지 못했다. 공공장소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의식적으로 작게 소리 냈고,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로 번역하기를 꺼려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페미니스트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와 메갈을 동어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기적이거나 폭력적인 메갈로 오해받기 싫었다. 또, 페미니스트라면 PC(Political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하거나, 탈코르셋을 한 외관을 가져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PC하기엔 너무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매일 화장을 하며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페미니즘을 그렇게 생각했다. PC하고, 모두가 숏컷하고 바지 입는, 혹은 메갈인 것.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온 친구가 나 진짜 페미니스트 같지 않아? 라고 말한 날이 있었다. 그때 친구는 자신의 발언이 언피씨하다고 바로 정정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었다. 페미니스트다운 것, ‘진짜 페미니스트’의 이미지 말이다. 시간이 흘러 내가 서점에서 일하게 됐을 때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라는 책을 보게 된 적이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낙인의 의미로 페미니스트 되기는 밥 먹듯이 쉽지만, ‘진짜’ 페미니스트는 너무도 숭고하여 셀수 없이 많은 판관들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나는 ‘진짜’를 지향하지 않는다. ‘진짜’가 되려는 윤리적 욕망은 때로 타인을 폭력적으로 규정짓고 배척하며 제압할 위험이 있다. (이라영,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들어가는...
1. 정체화된 페미니즘의 현장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긍정적인 지지를 보냈다. 페미니즘을 통해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조금 더 나에 가깝게 설명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동안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지 못했다. 공공장소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의식적으로 작게 소리 냈고, 페미니즘을 여성주의로 번역하기를 꺼려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페미니스트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와 메갈을 동어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기적이거나 폭력적인 메갈로 오해받기 싫었다. 또, 페미니스트라면 PC(Political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하거나, 탈코르셋을 한 외관을 가져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PC하기엔 너무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매일 화장을 하며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페미니즘을 그렇게 생각했다. PC하고, 모두가 숏컷하고 바지 입는, 혹은 메갈인 것.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온 친구가 나 진짜 페미니스트 같지 않아? 라고 말한 날이 있었다. 그때 친구는 자신의 발언이 언피씨하다고 바로 정정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었다. 페미니스트다운 것, ‘진짜 페미니스트’의 이미지 말이다. 시간이 흘러 내가 서점에서 일하게 됐을 때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라는 책을 보게 된 적이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낙인의 의미로 페미니스트 되기는 밥 먹듯이 쉽지만, ‘진짜’ 페미니스트는 너무도 숭고하여 셀수 없이 많은 판관들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나는 ‘진짜’를 지향하지 않는다. ‘진짜’가 되려는 윤리적 욕망은 때로 타인을 폭력적으로 규정짓고 배척하며 제압할 위험이 있다. (이라영,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들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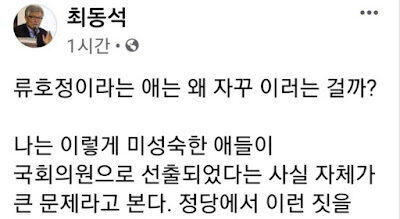
지난 연재 읽기
아젠다 사장칼럼
나까지 보탤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준석’에 대해. <아젠다>가 뭐 정론지도 아니고 내가 뭐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 <아젠다>가 시사저널도 아니고 내가 시사평론가도 아니니 기껏해야 50명 좀 넘게 구독하는 <아젠다>의 친구들에게 이준석 현상에 대해 혹은 이준석으로 촉발된 몇 가지 개인적 단상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금의 요란한 이준석 현상에 대한 나의 태도는 뭐랄까, 한편으로는 쏠쏠한 재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그만 봐도 상관없는 TV 연예프로그램이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 물론 의미 있는 쟁점도 있다. 얼마 전 읽은 「능력주의 비판을 비판한다」 (이범, 2021.06.10. 경향신문) 같은 과감한(?) 칼럼, 이에 대해 “조만간 24만자 정도의 글로 이런 무지한 소리들을 비판”하겠다는 박권일의 코멘트 같은 것. 그러나 이 밖에는 대체로 “세대교체의 바람과 변화에 대한 바람을 담아” 따위의 식상한 멘트, 혹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거나 “이준석발(發) 정치혁명” 같은 호들갑, 혹은 배 들어왔을 때 노 젓겠다는 식의 청년동원 이벤트들의 소란스러움뿐이다. 바람 같은 것,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식혜 위에 동동 뜬 밥풀”^^ 같은 것, 이게 작금의 이준석 현상에 대한 나의 인상평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준석의 현충원 방명록 글씨를 두고 민 아무개라는 국회의원이 “신언서판” 어쩌고, “어색한 문장” 어쩌고 하면서 훈수를 두었을 때였다. 왜냐하면 나 역시 포털에서 그의 글씨체를 본 순간 ‘헉’ 싶은 마음이 들었고, 문장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며, 동시에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네 글자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 아무개라는,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당에서조차 ‘수구꼴통’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내가 정확하게 같은 정서반응을 보이고 똑같은 사자성어를 떠올린 것이었다. 헐, 내 안에 민 아무개 있었어?...
나까지 보탤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준석’에 대해. <아젠다>가 뭐 정론지도 아니고 내가 뭐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 <아젠다>가 시사저널도 아니고 내가 시사평론가도 아니니 기껏해야 50명 좀 넘게 구독하는 <아젠다>의 친구들에게 이준석 현상에 대해 혹은 이준석으로 촉발된 몇 가지 개인적 단상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금의 요란한 이준석 현상에 대한 나의 태도는 뭐랄까, 한편으로는 쏠쏠한 재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그만 봐도 상관없는 TV 연예프로그램이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 물론 의미 있는 쟁점도 있다. 얼마 전 읽은 「능력주의 비판을 비판한다」 (이범, 2021.06.10. 경향신문) 같은 과감한(?) 칼럼, 이에 대해 “조만간 24만자 정도의 글로 이런 무지한 소리들을 비판”하겠다는 박권일의 코멘트 같은 것. 그러나 이 밖에는 대체로 “세대교체의 바람과 변화에 대한 바람을 담아” 따위의 식상한 멘트, 혹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거나 “이준석발(發) 정치혁명” 같은 호들갑, 혹은 배 들어왔을 때 노 젓겠다는 식의 청년동원 이벤트들의 소란스러움뿐이다. 바람 같은 것,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식혜 위에 동동 뜬 밥풀”^^ 같은 것, 이게 작금의 이준석 현상에 대한 나의 인상평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준석의 현충원 방명록 글씨를 두고 민 아무개라는 국회의원이 “신언서판” 어쩌고, “어색한 문장” 어쩌고 하면서 훈수를 두었을 때였다. 왜냐하면 나 역시 포털에서 그의 글씨체를 본 순간 ‘헉’ 싶은 마음이 들었고, 문장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며, 동시에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네 글자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 아무개라는,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당에서조차 ‘수구꼴통’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내가 정확하게 같은 정서반응을 보이고 똑같은 사자성어를 떠올린 것이었다. 헐, 내 안에 민 아무개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