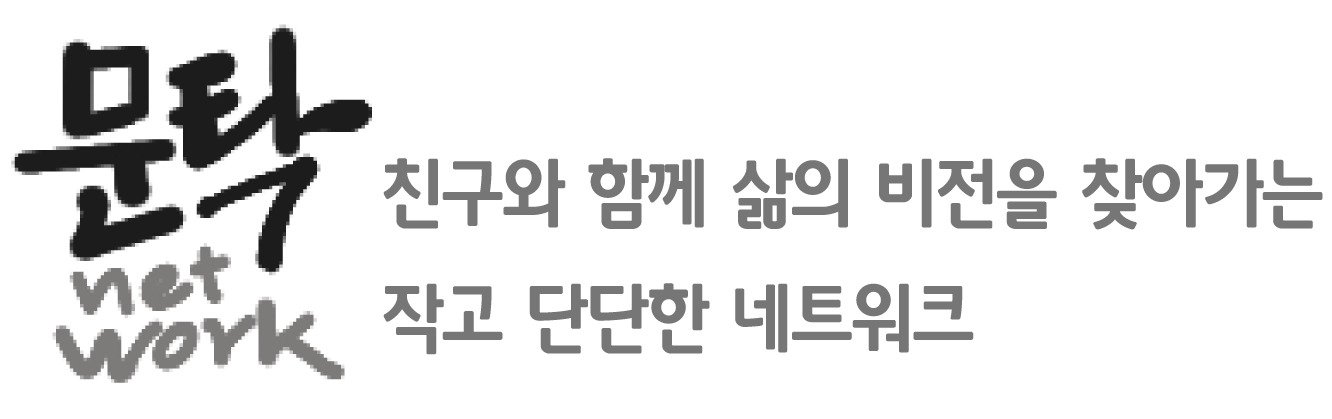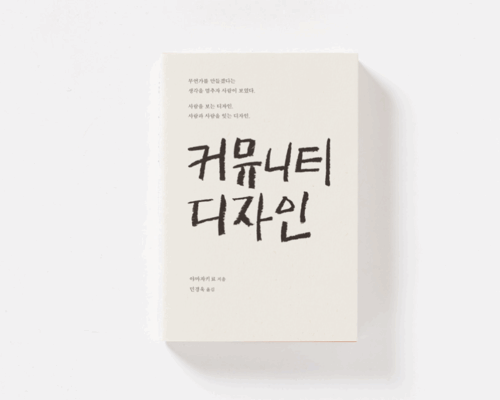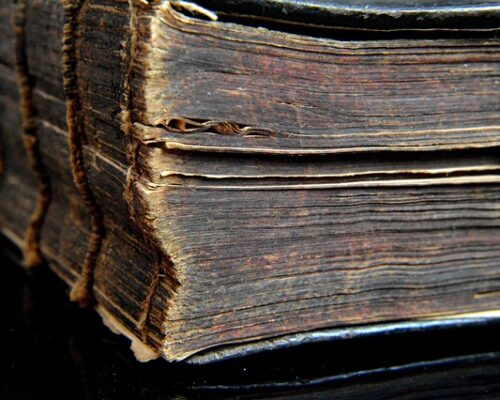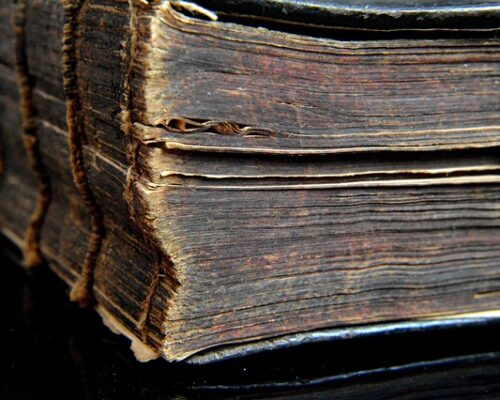
방과 후 고전 중
주자가 『본의(本義)』를 지은 까닭은 주역 공부를 해야겠다고 늘 생각한다. 하지만 주역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주자가 쓴 『근사록(近思錄)』을 잘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2017년 처음 근사록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근사록』의 1편 「도체(道體)」를 보면 괘에 대한 문장이 많은데, 거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읽었다. 『주역』을 읽어본 적도 없었고, 다음 편인 「위학(爲學)」편의 글들과 많이 다르게 느껴져 생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도체」에 나온 글들이 주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훨씬 후에 알았고, 그 글들이 왜 『근사록』의 첫머리가 되어야 했는지는 그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다. 역, 주역, 주역전의, 주역본의 … 고전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 이름이다.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본명도 있고, 호(號)도 있고, 자(字)도 있고, 관직명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죽고 난 뒤에 시호(諡號)도 있고. 이걸 다 섞어서 쓰니까, 읽으면서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떨 때는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책 이름도 비슷한 예가 있다. 인명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책을 다르게 부르면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선 매번 새로운 책을 만나는 기분이 든다. 예를 들자면 서경(書經)을 서(書), 상서(尙書) 등으로 부르는데 경전의 의미를 밝히면 서경으로, 존귀한 책의 의미로는 상서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역(周易)도 역(易), 역경(易經), 등으로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이문서당’에서 공부한 주역 책에는 단순히 ‘주역’, 혹은 ‘역’이라고 되어...
주자가 『본의(本義)』를 지은 까닭은 주역 공부를 해야겠다고 늘 생각한다. 하지만 주역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주자가 쓴 『근사록(近思錄)』을 잘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2017년 처음 근사록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근사록』의 1편 「도체(道體)」를 보면 괘에 대한 문장이 많은데, 거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읽었다. 『주역』을 읽어본 적도 없었고, 다음 편인 「위학(爲學)」편의 글들과 많이 다르게 느껴져 생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도체」에 나온 글들이 주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훨씬 후에 알았고, 그 글들이 왜 『근사록』의 첫머리가 되어야 했는지는 그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다. 역, 주역, 주역전의, 주역본의 … 고전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 이름이다.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본명도 있고, 호(號)도 있고, 자(字)도 있고, 관직명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죽고 난 뒤에 시호(諡號)도 있고. 이걸 다 섞어서 쓰니까, 읽으면서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떨 때는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책 이름도 비슷한 예가 있다. 인명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책을 다르게 부르면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선 매번 새로운 책을 만나는 기분이 든다. 예를 들자면 서경(書經)을 서(書), 상서(尙書) 등으로 부르는데 경전의 의미를 밝히면 서경으로, 존귀한 책의 의미로는 상서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역(周易)도 역(易), 역경(易經), 등으로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이문서당’에서 공부한 주역 책에는 단순히 ‘주역’, 혹은 ‘역’이라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