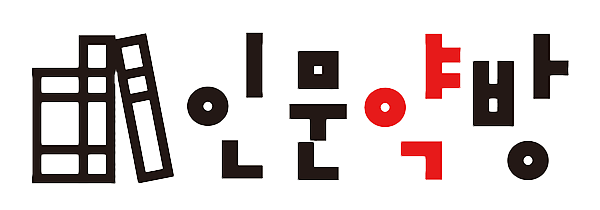아스퍼거는 귀여워
감자는 정말, 정말정말정말 오줌, 똥을 못 가렸다. 만 3살이 지나, 한국 나이로 5살이 되었는데도, 기저귀를 못 뗐으니 말 다 했지. (네이버에 쳐보니 ‘기저귀를 떼는 시기는 18개월에서 24개월이 적당하다.’라고 쓰여있다) 발육이 남다른 감자에게 맞는 기저귀 사이즈가 더 이상 없어서, 더 큰 기저귀를 찾으려면 성인용으로 가야 할 판이였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일단 벗기고 팬티를 입혀 놓으면 자신도 축축한 것을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떼게 된다나? 그 말을 믿고 덜컥 어린이집 적응과 배변 훈련을 동시에 해버리자는 안일한 생각을 해버렸다. 어린이집 적응도 힘든 마당에 배변 훈련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나도 울고, 감자도 울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마도) 울었다. 기저귀 벗기 강제집행을 시행한 후, 어린이집에서 하루 평균 2~3번 오줌을 쌌다. 여벌 바지와 팬티를 수도 없이 챙기고, 심지어 바지가 모자라는 날은 친구 것을 빌려 입고 오는 일도 허다했다. 외출 시에는 무조건 화장실만 보이면 억지로 오줌을 뉘었다. 내가 신경 써서 화장실을 보내면 괜찮지만, 조금만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있거나, 내가 집안일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실수했다. 외출도 불안하고, 늘 둘 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도 늘상 실수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오줌은 나았는데, 똥 문제는 정말 심각했다. 갈수록 똥 누는 걸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나중에 가서는 변을 5일에서 일주일 정도에 한 번 눴다. 똥은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서 더 누기 힘든 악순환. 온갖...
감자는 정말, 정말정말정말 오줌, 똥을 못 가렸다. 만 3살이 지나, 한국 나이로 5살이 되었는데도, 기저귀를 못 뗐으니 말 다 했지. (네이버에 쳐보니 ‘기저귀를 떼는 시기는 18개월에서 24개월이 적당하다.’라고 쓰여있다) 발육이 남다른 감자에게 맞는 기저귀 사이즈가 더 이상 없어서, 더 큰 기저귀를 찾으려면 성인용으로 가야 할 판이였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일단 벗기고 팬티를 입혀 놓으면 자신도 축축한 것을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떼게 된다나? 그 말을 믿고 덜컥 어린이집 적응과 배변 훈련을 동시에 해버리자는 안일한 생각을 해버렸다. 어린이집 적응도 힘든 마당에 배변 훈련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나도 울고, 감자도 울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마도) 울었다. 기저귀 벗기 강제집행을 시행한 후, 어린이집에서 하루 평균 2~3번 오줌을 쌌다. 여벌 바지와 팬티를 수도 없이 챙기고, 심지어 바지가 모자라는 날은 친구 것을 빌려 입고 오는 일도 허다했다. 외출 시에는 무조건 화장실만 보이면 억지로 오줌을 뉘었다. 내가 신경 써서 화장실을 보내면 괜찮지만, 조금만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있거나, 내가 집안일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실수했다. 외출도 불안하고, 늘 둘 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도 늘상 실수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오줌은 나았는데, 똥 문제는 정말 심각했다. 갈수록 똥 누는 걸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나중에 가서는 변을 5일에서 일주일 정도에 한 번 눴다. 똥은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서 더 누기 힘든 악순환. 온갖...

아스퍼거는 귀여워
모로 올해부터 일리치 약국에서 일하고 있다. 열심히 쌍화탕을 달이며, 공부와 삶이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항상 궁리중. 포르투갈에 갔다. 한국에서 암스테르담까지 14시간 반을 날아간 뒤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2시간 반을 비행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 유럽의 땅끝마을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거리였다. 남편은 일 때문에 여행 후반에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랑 둘이 떠나야 했다. 짐도 많고, 환승도 오랜만인 데다, 비행기도 잘 못 타는 쫄보라 이래저래 걱정된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파김치가 되어 도착한 숙소에서 짐을 탁 풀고 창문을 열자 아이가 내뱉은 첫마디. “엄마, 여기 참 평화로운 거 같아요.” 우리가 도착한 포르투갈의 두 번째 도시 포르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포르투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첫 번째 숙소는, 앞으로는 도우강이 흐르고, 멀리 동루이스 다리가 보이는 낭만적인 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라인으로 평범하고 작은 카페가 3개 있었는데, 단골들이 맥주를 한잔하거나, 간단한 요기를 하러 왔다. 나와 아이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카페에서 토스트나 에그타르트를 먹고, 시간 날 때마다 집 앞을 산책했다. 매일 비슷한 길을 걸어 장을 보러 가고, 모루 공원에 앉아서 버스킹을 듣거나 갈매기를 구경했다.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싸 온 햇반에 김, 혹은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거나 미역국을 먹었다. 포르투의 12월은 영상 5도에서 15도 정도로, 낮에는 꽤 포근하다. 우기라고...
모로 올해부터 일리치 약국에서 일하고 있다. 열심히 쌍화탕을 달이며, 공부와 삶이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귀여운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항상 궁리중. 포르투갈에 갔다. 한국에서 암스테르담까지 14시간 반을 날아간 뒤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2시간 반을 비행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 유럽의 땅끝마을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거리였다. 남편은 일 때문에 여행 후반에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랑 둘이 떠나야 했다. 짐도 많고, 환승도 오랜만인 데다, 비행기도 잘 못 타는 쫄보라 이래저래 걱정된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파김치가 되어 도착한 숙소에서 짐을 탁 풀고 창문을 열자 아이가 내뱉은 첫마디. “엄마, 여기 참 평화로운 거 같아요.” 우리가 도착한 포르투갈의 두 번째 도시 포르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포르투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첫 번째 숙소는, 앞으로는 도우강이 흐르고, 멀리 동루이스 다리가 보이는 낭만적인 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라인으로 평범하고 작은 카페가 3개 있었는데, 단골들이 맥주를 한잔하거나, 간단한 요기를 하러 왔다. 나와 아이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카페에서 토스트나 에그타르트를 먹고, 시간 날 때마다 집 앞을 산책했다. 매일 비슷한 길을 걸어 장을 보러 가고, 모루 공원에 앉아서 버스킹을 듣거나 갈매기를 구경했다.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싸 온 햇반에 김, 혹은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거나 미역국을 먹었다. 포르투의 12월은 영상 5도에서 15도 정도로, 낮에는 꽤 포근하다. 우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