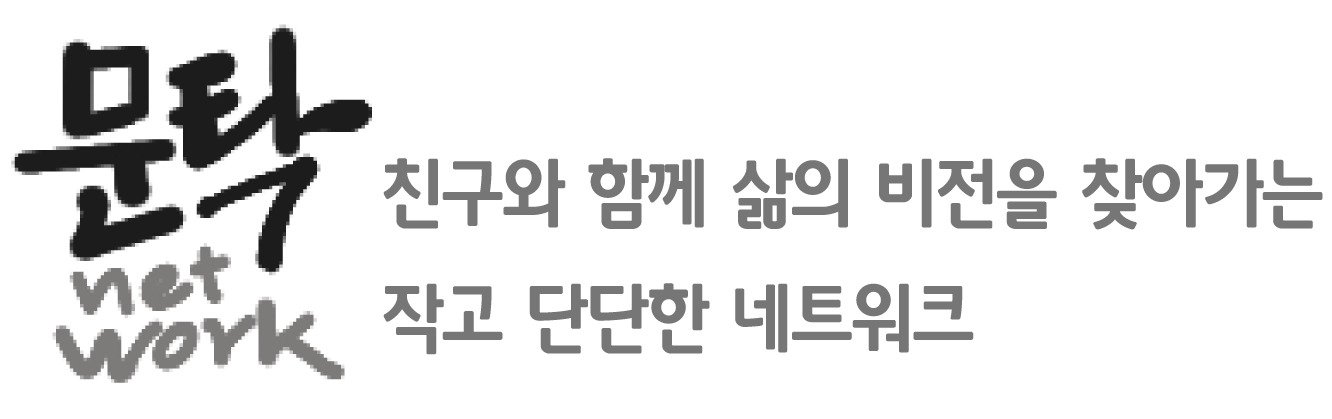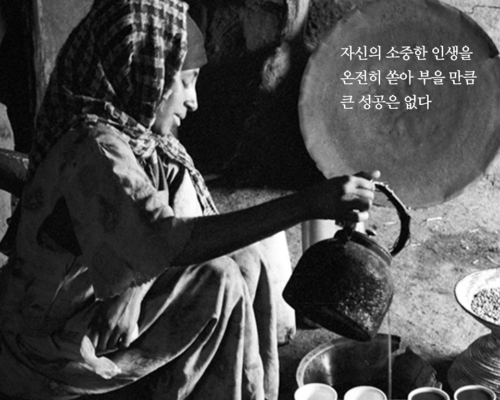한문이예술
거북의 그 ‘거대한 시간’에 대하여 동은 1. 거북이를 좋아하는 선생과 학생의 만남 나는 거북이를 좋아한다. 아마 나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다. “네가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 그 질문에 답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동물 중에서도 거북이를 좀 더 좋아한다. 무언가를 좋아할 때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누군가는 거북이를 동물계 척삭동물문, 파충강의 거북목으로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이해하고 싶어하거나 어떤 종류와 부위, 과거를 갖고 있는가를 줄줄 외우며 익히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의 경우에는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만다. 어느 날 정신 차리니 좋아하는걸 깨닫고 그 이후에 이유를 찾게 되는 식이다. 내가 깨달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북이의 등껍질의 지문같은 주름들, 매끈하면서도 나른한 눈의 모양, 꾹 다문 입의 곡선, 다양한 형태의 발톱과 느릿한 걸음걸이, 혹은 하늘을 나는 듯 바다를 헤엄치는 몸짓같은 것들… 더더더 많지만 지면상 생략하도록 하겠다. 잠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북이 미쳐있다거나 거북이를 위해 살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냥 좋아한다고만 생각해달라. (한때 평생 남미의 거북이 봉사자로 사는 걸 꿈꾸기도했지만…….) 혹시 첫 글에서 비 우雨로 시작했던 첫 수업에 대해서 기억하는가? 굉장히 있어보이는 말들로 글을 마무리했지만 첫 수업때의 나는 극도의 긴장상태였다.(링크) 나는 긴장하면 오류난 기계처럼 굳어버리고 마는데,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갈수록 긴장은 배가 됐다. 그렇게 시작된 수업, 첫 시간이니 인사와 함께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개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거북의 그 ‘거대한 시간’에 대하여 동은 1. 거북이를 좋아하는 선생과 학생의 만남 나는 거북이를 좋아한다. 아마 나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다. “네가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 그 질문에 답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동물 중에서도 거북이를 좀 더 좋아한다. 무언가를 좋아할 때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누군가는 거북이를 동물계 척삭동물문, 파충강의 거북목으로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이해하고 싶어하거나 어떤 종류와 부위, 과거를 갖고 있는가를 줄줄 외우며 익히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의 경우에는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만다. 어느 날 정신 차리니 좋아하는걸 깨닫고 그 이후에 이유를 찾게 되는 식이다. 내가 깨달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북이의 등껍질의 지문같은 주름들, 매끈하면서도 나른한 눈의 모양, 꾹 다문 입의 곡선, 다양한 형태의 발톱과 느릿한 걸음걸이, 혹은 하늘을 나는 듯 바다를 헤엄치는 몸짓같은 것들… 더더더 많지만 지면상 생략하도록 하겠다. 잠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북이 미쳐있다거나 거북이를 위해 살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냥 좋아한다고만 생각해달라. (한때 평생 남미의 거북이 봉사자로 사는 걸 꿈꾸기도했지만…….) 혹시 첫 글에서 비 우雨로 시작했던 첫 수업에 대해서 기억하는가? 굉장히 있어보이는 말들로 글을 마무리했지만 첫 수업때의 나는 극도의 긴장상태였다.(링크) 나는 긴장하면 오류난 기계처럼 굳어버리고 마는데,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갈수록 긴장은 배가 됐다. 그렇게 시작된 수업, 첫 시간이니 인사와 함께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개 시간에는 아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