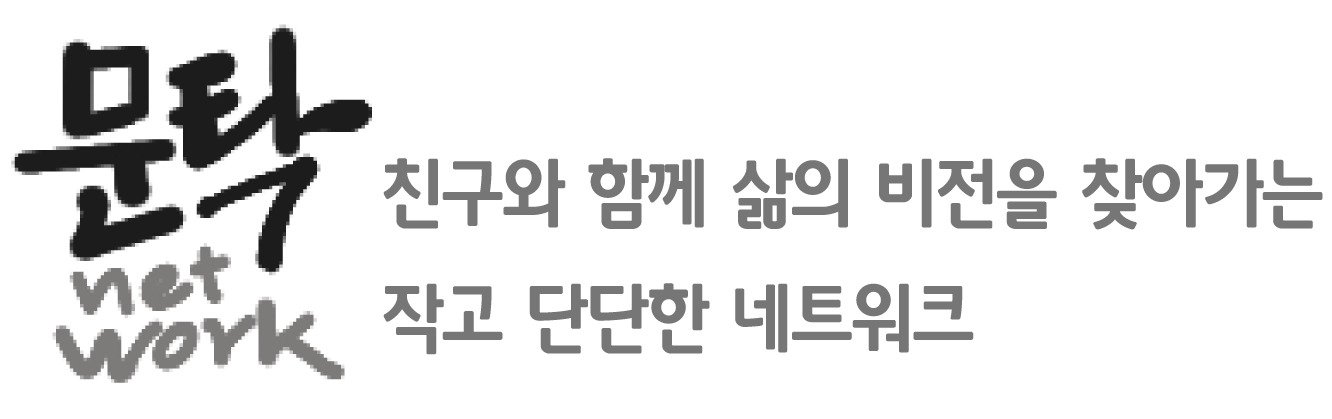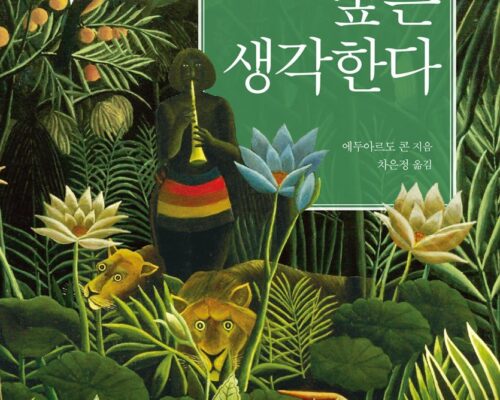세미나 에세이 아카이브
이 글은 2024년 1분기 '읽고쓰기1234'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읽고쓰기1234'는 문탁네트워크 회원들이 1년에 4번, 3개월에 한번씩, 1박2일 동안 각자 읽고 공부한 책에 관해 쓴 글들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들이 발표한 글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이 코너를 유심히 보시면 문탁네트워크 회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나아가 앞으로 문탁네트워크의 공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다시 묻다 『신원인』, 펑유란, 필로소픽, 2022 진달래 처음 이 책에 눈이 갔던 건 지은이가 펑유란(馮友蘭)이라는 것, 또 혹시 내년 [고전학교]에서 『논어』를 읽는다면 인(仁)에 대해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용』에 “인이란 인간다운 것이다(仁者人也)”라는 말이 있다. 흔히 어질다는 뜻의 인(仁)과 사람 인(人)은 통용된다고도 하고, 인(仁)을 ‘사람다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仁)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혹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인(仁)에 대한 해석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조금씩 변형된다. 먼저 『논어』에서는 인을 충(忠)과 서(恕)로 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 성실성(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恕)’가 사람다움의 기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전국시대 『맹자』에 이르면 인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인의(仁義)로, 좀 더 사회적인 함의를 얻게 된다. 송대(宋代) 이후로 넘어 오면 인이 이치(理)로 파악되기에 이르고,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만물일체’를 인(仁)으로 본다. 청대(淸代) 이후에 인은 자기와 타자간의 상호 관계적...
이 글은 2024년 1분기 '읽고쓰기1234'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읽고쓰기1234'는 문탁네트워크 회원들이 1년에 4번, 3개월에 한번씩, 1박2일 동안 각자 읽고 공부한 책에 관해 쓴 글들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들이 발표한 글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이 코너를 유심히 보시면 문탁네트워크 회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나아가 앞으로 문탁네트워크의 공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다시 묻다 『신원인』, 펑유란, 필로소픽, 2022 진달래 처음 이 책에 눈이 갔던 건 지은이가 펑유란(馮友蘭)이라는 것, 또 혹시 내년 [고전학교]에서 『논어』를 읽는다면 인(仁)에 대해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용』에 “인이란 인간다운 것이다(仁者人也)”라는 말이 있다. 흔히 어질다는 뜻의 인(仁)과 사람 인(人)은 통용된다고도 하고, 인(仁)을 ‘사람다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仁)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혹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인(仁)에 대한 해석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조금씩 변형된다. 먼저 『논어』에서는 인을 충(忠)과 서(恕)로 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 성실성(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恕)’가 사람다움의 기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전국시대 『맹자』에 이르면 인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인의(仁義)로, 좀 더 사회적인 함의를 얻게 된다. 송대(宋代) 이후로 넘어 오면 인이 이치(理)로 파악되기에 이르고,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만물일체’를 인(仁)으로 본다. 청대(淸代) 이후에 인은 자기와 타자간의 상호 관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