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함--살아가는 힘
먼불빛
2024-04-21 05:26
24
15년 전에 어떤 후배 동료가 물었다.
“그런 일이 내게도 생기면 어떻게 하죠?, 참 두렵네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하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
그리고 나와 동갑인 한 남자가 말했다.
“그럴 땐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하지? 00님이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며 나를 바라봤다. 그는 마치 ‘너는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 할 말이 좀 있지 않겠어?’하는 듯한 태도로 모두의 시선을 일순간 내게로 쏠리게 만들었다. (개자식..)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왜 그 대답을 내가 해주는게 그 상황에서 요구됐는지는…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런 응변에 능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며 뜸을 들였던 기억밖에는. 나도 루시 오빠처럼 모른다고, 시종일관 모른다고 솔직히 답했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 상황에 떠밀려 이렇게 답했던 것 같다.
”세상에 생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만 예외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 그 일을 견뎌낼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힘을 키워야지 그 일이 나를 비껴가기를 바라는 일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
나는 간신히, 그러나 조금은 격앙되어,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선배처럼 감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순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거나,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내가 이혼한 얘기를, 이혼한 전 남편이 얼마나 더 나쁜 인간인지를 침튀겨가며, 내가 옳았음을 좌중을 웃겨 가며 무용담처럼 떠벌렸었는지도 모른다.
‘힘’이라니…결정적으로 그런 ‘힘’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혹은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그런(아마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거나 견뎌낼 힘 같은 것) ‘힘’을 키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난 오래도록 내 스스로에게 그 답을 얻고자 고심했다.
“하지만 나는 진정, 냉혹함은 나 자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게 나야, 나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곳—일리노이 주 앰개시—에는 가지 않을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은 하지 않을 거고, 나 자신을 움켜잡고 인생을 헤치며 앞으로, 눈먼 박쥐처럼 그렇게 계속 나아갈 거야!, 라고. 이것이 그 냉혹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204~205쪽)
루시 바턴의 이 문장은 문득 그 때를 떠올리게 한다. ‘자기 자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외쳤던 ‘의연함’이라는 단어나 혹은 버티다, 견뎌내다 같은 단어와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졌다.
그 단어를 내 신조로 삼게 된 것은 이혼 직후, 남편과 내가 반반씩 나눠가진 빚을 갚는 일, 그리고 몇달간 실업자 신세로 당장 끼니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하는 고민 따위를 했던 참으로 암담했던 때였다. 몰래 뒷베란다에 꼬불쳐 둔 담배를 태우면서 나는 울지 않고 의연하게 버티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가족에게는 이혼도, 빚도, 모든 것이 비밀이어야만 했다. 결혼도 내 맘대로 했고, 이혼도 내 맘대로 했으니, 굶어 죽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는 ‘의연함’이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령 무슨 일이 있었어도 감쪽같이 없던 일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 모든 일을. 마치 닥치는 몹쓸 일 모두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한시도 의연하지 못했다. 언제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시간들이 펼쳐졌다. 카드 돌려막기로 보내는 세월이 편할 날이 있을까? 살얼음판 같은 나날들을 나는 어떻게 보냈는지…기억도 나지 않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날들이다. 그나마 살고 있던 빌라를 팔면 빚잔치를 하고 어떻게라도 살아보련만, 경기도 광주 외곽의 볼품없는 빌라는 내 놓은지 5년이 넘도록 입질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 나에게 남은 건 증오밖에 없었다. 이혼하기 전에는 그 모든 분노와 증오를 남편에게 퍼부으며 풀었던 것 같다. 물론 원인 제공을 남편이 한 꼴이니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딱히 돈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그와 살아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결혼 13년만의 지리한 과정 끝에 낸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혼을 하자, 그동안 나를 버티게 했던 힘은 증오가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누구를 원망할 상대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오로지 내 몫으로 남게 되자, 갑자기 힘이 쭉 빠졌다. 그때부터 그 증오와 분노는 나를 향했다. 그리고 마침 딸의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내 인생에 대한 분노와 딸의 분노가 한데 섞여 소용돌이쳤다. 사랑해주지 못하는 엄마와 (내 생각에)겨우 사랑 따위에 목매는 철부지가 서로의 상처를 들쑤셨다. 엉망이었다. 그래도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직장을 얻었고, 가끔 빚 때문에 비굴한 시간을 보냈고, 아슬아슬 외줄타기처럼 빚과 돈과 자식과 싸우며 한 시절을 건너왔다. 나는 울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표정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온통 그늘로 가득한 얼굴로 변해 있었다. 진정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붙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 때 내가 생각했던 ‘의연함’이란 나를 지탱해준 그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았지만, 나는 루시 바턴의 ‘냉혹함“을 읽고 비로소 그 ’힘‘과 등치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왠지 루시 바턴의 그 냉혹함에는 ’사랑‘이 있어 보였다. 외로웠고, 불완전했지만 사랑했고, 그것 모두가 자신 것임을 알고 끌어 안는 것. 반면 나의 의연함에는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외롭지 않다고, 사랑 따위 필요없다고, 그 모두가 실패한 인생일 뿐이라고 더 들여다 보지 않으려는 거부와 닿아 있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지워지지 않는 갈망을 만들어준 엄마가 되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것은 결코 지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이 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후회때문인지... 아니면 원망이었는지, 그 모든 것이었다 해도 할 말은 없다. 어쩌면 그것은 딸이 내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것이기도 하면서 딸의 것이기도 하므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234 |
냉혹함--살아가는 힘
(1)
먼불빛
|
2024.04.21
|
조회 24
|
먼불빛 | 2024.04.21 | 24 |
| 233 |
루시 바턴과 나
(1)
이든
|
2024.04.21
|
조회 20
|
이든 | 2024.04.21 | 20 |
| 232 |
엄마에게도 가슴 시린 연애와 이별의 시절이 있었다
(1)
유유
|
2024.04.21
|
조회 26
|
유유 | 2024.04.21 | 26 |
| 231 |
루시 바턴에게 배운 것들
(1)
겸목
|
2024.04.20
|
조회 31
|
겸목 | 2024.04.20 | 31 |
| 230 |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랑을 하니까요"
(2)
꿈틀이
|
2024.04.20
|
조회 37
|
꿈틀이 | 2024.04.20 | 37 |
| 229 |
엄마의 황금시절
수영
|
2024.04.20
|
조회 19
|
수영 | 2024.04.20 | 19 |
| 228 |
아빠의 기억
(1)
단풍
|
2024.04.20
|
조회 20
|
단풍 | 2024.04.20 | 20 |
| 227 |
이해한다는 오해
(1)
시소
|
2024.04.20
|
조회 31
|
시소 | 2024.04.20 | 31 |
| 226 |
사용 목적이 명확한 사람
(5)
이든
|
2024.04.07
|
조회 61
|
이든 | 2024.04.07 | 61 |
| 225 |
소중한 마음의 여유
(1)
무이
|
2024.04.07
|
조회 27
|
무이 | 2024.04.07 | 27 |
| 224 |
경주의 추억
(5)
유유
|
2024.04.06
|
조회 45
|
유유 | 2024.04.06 | 45 |
| 223 |
누가 나를 규정하는가?
(5)
수영
|
2024.04.06
|
조회 47
|
수영 | 2024.04.06 |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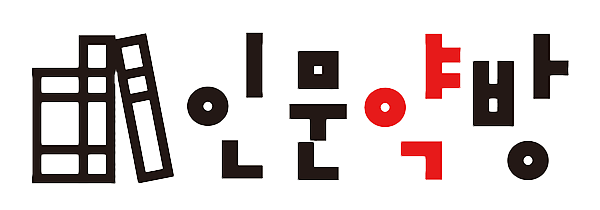
다시 읽어보니 깜깜했던 시절을 냉혹하게 관통하는 글이네요.
속단하지 않고, 궁금해 하며 그 시절의 혼돈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
쌤의 글쓰기가 왜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왜 독자에겐 읽고 싶어지는 글인지도.
답을 정해 놓고 쓰지 않으니... 진짜 같은 글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