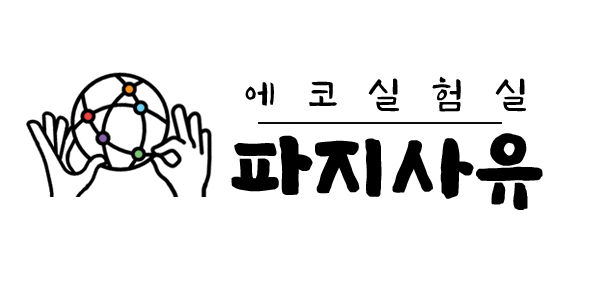[해석] 제37절 근거율의 제조와 ‘준거’ ― ‘여기에 왜는 있다’
건달바
2016-01-19 19:50
432
제37절 근거율의 제조와 ‘준거’ ― ‘여기에 왜는 있다’
그렇다면, 법학자 르장드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근거율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성이나 이유 같은 것은 없어도 좋다. 왜 따위 물음은 귀찮고 성가실 뿐이고, 근거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자유다 하는 등 근래 들떠 있는 사고방식은 흔해빠져 지루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적이다. 왜인가. 여기에서 프리모 레비의 그 증언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아우슈비츠의 간수가 그에게 통고한 ‘여기에 왜는 없다 (Hier ist kein Warum)' 주1)를 인용해야만 할까. 그렇다, 아우슈비츠에 왜는 없었다. 그 비(非)-시공에서 유대인을 살해하는 것에 이유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 외에, 르장드르는 다큐멘터리 작가 리샤르 딘도가 1987년에 제작한 영화 ‘다니, 미시, 리나트+막스’를 인용한다. 그것은 80년부터 81년 사이에 취리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젊은이들의 폭동을 네 명의 희생자를 통해 그려 내고자 한 작품이다. 마피아적인 폭력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어, 마약을 매매하고 사용하는 것에 빠져든, 정치권력과 상상적으로 ‘쌍수적=결투적’인 관계를 갖는 것만 허락된,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젊은데 파멸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빠져드는 ‘출구 없는’ 자멸적인 말로가 그려진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기초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딘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결투의 정치적, 법적 제도’라는 상황 아래에서는, 모든 주체가 자신의 행동의 척도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병원 침상에서 친구가 리나트를 칼로 베어 상처를 내고 만다. 그것은 리나토와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때 경찰관들은, 리나트와 친구가 사실은 증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역주1) 그런데도 교활하게 속셈이 있는 사기에 몸을 맡겨버린 것이었다. 이것은 젊은이를 후려갈겨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것과 같다. 재판관은 그들 자신이 결투에 휘말려버렸다는 것 이외 아무것도 여기에서는 알 수 없는 까닭에, 그런 재판관의 결의론(決疑論) 따위 믿을 수 없다.
이렇듯, 이 영화가 경고가 되어 상기시켜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고만 젊은이들의 전망 없는 절망이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인간이다. 그것은 리나트의 묘비명이 증언해준다. 그 묘비명은 이렇다. ‘왜?’ 주2)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근거율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말해야만 한다. 여기에 왜는 있고 여기에는 왜가 있다고. 왜라고 묻을 수 있도록, 왜에 답이 있도록, 답이 없는 왜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떻게. 그렇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말해왔다.
그렇다. 근거율과 인과율에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반복에 의해, 미적 = 감성적인 반복에 의해, 즉 ‘도그마틱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보자. 근거율은 예술이고, 근거는 미적 · 감성적으로만 보인다. 즉 우리의 논리로 말하면, 시니피앙이기도 이미지이기도 한 무언가에 의해. 텍스트이기도 이미지이기도 엠블럼이기도 한 무언가에 의해. 예를 들면 자신이 자신인 ‘근거’를, 즉 자신의 존재의 ‘증거’를 보이기에는 제삼자에게 보증되는 한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엠블럼틱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자신이 자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 작은 손거울 같은 ID 카드를 필요로 할까? 나는 나로서 여기에 존재하는데 검문소나 관공서나 세관 등에서는 그것보다 이 작은 손거울이 ─ 거기에는 말과 이미지가 물질적으로 심어져 있다 ─ 자기 자체의 존재보다 우선시 된다. 그것에 ‘준거’하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자신이 자신인 것조차도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검문소에 수십 명의 친구를 데려와도 소용없다. 저 사람이 ‘확실히 이 사람은 아무개다’라고 증명을 해주어도, 그럼 그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어떤지를 증명해줄 사람은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럼 또 한 사람 데려와도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하 무한히 계속된다. 확실히 이런 예는 익살스럽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익살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입증’의, 준거의 연쇄를 어딘가에서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 준거’가 있어야만 한다. 제삼자로서의 그 작은 거울을 ‘참된 것’으로 스스로에게 보증하는 것임을 가정해야만 우리는 그것을─바로 증거를,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서─제시하고, 매일매일 학교나 도서관, 회사나 공장의 입구를 왕래할 수 있는 것이다. 저 ID 카드에 나타난 작은 자기 이미지와 짧은 문자열이 자신이 자신이라는 ‘진리’를 입증하고, 그 ‘증거’ ‘근거’를 제시한다. 이 작은 손거울, ID 카드가 ‘엠블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그러므로 르장드르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엠블럼은 결국 준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엠블럼은 이 전제된 절대적 타자의 메시지가 물질화된 증거이다.’ 이 ‘준거의 구체화’인 작은 손거울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법인’의 수준에 어울리는 크기를 지닌 무엇인가에 ‘절대적’으로 준거하지 않으면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무엇인가 자체가 <거울>로서 상연되어야만 한다. 이 ‘제삼자인 <거울>’을 정치하게 설치하는 것에 의해서만 ‘<근거율>의 사회적 상연’이 행해진다. 왜냐하면 ‘거울은 인간에게 있어 자기원인(cause de soi)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거울은 결과로서의 기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상기해 보자. 거울상 단계의 처음부터 <거울>은 자아의, 자기의 기원이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준거’가 되어야 할 모습이 있었다. ‘자, 이것이 나다.’ 그것은 완전한 은유의 섬광이었다. <거울>은 원인을, 인과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회의 수준과 주체의 수준이 구별되는 그 경계선상에서. 르장드르는 이 제시하는 작용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권력’이라고 부른다. ‘이 제시하는 권력은 규범 시스템을 다양한 형식으로, <정치>를 <미학>으로, 문화가 이룬 상징적 질서를 그 궁극의 근거에 연결하는 것에 존립하고’ 있고, ‘이 점, 사회와 주체가 분절되는 점에 있어서야말로 제시하는 권력은 의미를 갖고, 서양의 역사 시스템 속에서 <절대적 거울> 혹은 <정초하는 이미지>──즉 <신과 닮은 모습>이라는 언설로 조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론의 전개는 연극적 원리와 신화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유를, 원인을, 증거를, 근거를, ‘왜’에 응하여 ‘제시하는’ 것. 질문을 갖는 것, 질문할 수 있는 시공을 여는 것. 게다가 이미지로도, 텍스트로도. 이것이 주체의 생사를 제약하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 사회로서의 <거울>은 표상으로서의 주체를 생산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이 <거울>이 휘두르는 권력이야말로 제시하는 권력이었다. 그리고 이 <거울>은 이미지로서의 제삼자였다. 즉 여기서는 ‘<제삼자>는 <근거율>에 실질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즉 모든 사회는 논리에 대해서, 즉 표상이나 인과성의 언설에 대해 집요하게 호소하지만, 그것은 삶이 살며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삼자는 근거율에 실질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삶에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 사회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적 준거>를, <성스러운 거울>을 상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사람 형상들이 가까스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주1) 주90) Primo Levi, Se questo è un uomo, Torino, Einaudi, 1979, p.32. 프리모 레비 『아이슈비츠는 끝나지 않았다──어떤 이탈리아인 생존자의 고찰』竹山博英 역. 朝日新聞社, 1980년, 27쪽. 필자의 좁은 견식으로 보면 르장드르는 이 ‘왜는 없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프리모 레비의 같은 저서의 다른 곳을 한 번 인용하고 있고, 또 다른 저서를 한 번 인용하고 있다. 중세 교회법 문헌 속에서 반유대주의의 기원을 특정하는 노력을 거듭하였고, 자신의 부친이 나치 통치하의 프랑스에서 유대인의 강제이송과 강제노동에 최후까지 반대를 계속했던 남자였음을 그립게 회고한 그가 이 ‘왜는 없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페티 벤슬라마가 이 명석하기 짝이 없는 아감벤 비판 ‘표상과 불가능한 것’에서 이 저서의 이 부분에 주를 달아 인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50년이 지나도 『여기에 왜는 없다 Hier ist kein Warum』라는 말은 언제나 문명에 어두운 빛을 비추고 있고, 그 반복의 공포를 생각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한다. 현대 세계의 학살에 대한 역사 기술을 보면, 우리는 쇼아(Shoah)라고 하는 사건의 전철을 계속 밟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그 역사적 특이성의 저편에서 장 아메리가 말한 것처럼『히틀러는 사후 승리를 일구었다고 생각해야』한다. Fethi Benslama, 《La représentation et 1'impossible》, L'art et la mémoire des camps. représenter exterminer, sous la direction de Jean-Luc Nancy, Paris, Seuil, 2001, p.59.
역주1) 영화 설명(https://www.idfa.nl)에 따르면 리나트는 훔친 차로 도망가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 코마 상태에서 살다가 여자 친구에 의해 찔려 죽는다.
주2) 주91) Legendre, ET, 148-149. 이 부분은 ‘잔학한 소년범죄의 증가’, ‘마음의 어둠’을 선전하고 정치권력과 소년들과의 “상상적·결투적 관계”를 부추기는 입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되는 점에 유의하고 싶다. 그 현실성은 분명하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607 |
42절 수정해석
(4)
건달바
|
2016.02.25
|
조회 302
|
건달바 | 2016.02.25 | 302 |
| 606 |
357-358 단어
(7)
건달바
|
2016.02.20
|
조회 426
|
건달바 | 2016.02.20 | 426 |
| 605 |
41절 수정해석
(8)
건달바
|
2016.02.18
|
조회 401
|
건달바 | 2016.02.18 | 401 |
| 604 |
장기 결석계
(2)
인디언
|
2016.02.12
|
조회 488
|
인디언 | 2016.02.12 | 488 |
| 603 |
353 단어
(7)
주자일소
|
2016.02.11
|
조회 666
|
주자일소 | 2016.02.11 | 666 |
| 602 |
p.348 단어입니다.
(4)
토용
|
2016.01.30
|
조회 534
|
토용 | 2016.01.30 | 534 |
| 601 |
40절 338-339 수정해석
(1)
주자일소
|
2016.01.26
|
조회 274
|
주자일소 | 2016.01.26 | 274 |
| 600 |
야전과 영원 2부 르장드르 31~39절 해석(1차)
토용
|
2016.01.19
|
조회 324
|
토용 | 2016.01.19 | 324 |
| 599 |
[해석] 제37절 근거율의 제조와 ‘준거’ ― ‘여기에 왜는 있다’
건달바
|
2016.01.19
|
조회 432
|
건달바 | 2016.01.19 | 432 |
| 598 |
p343단어와 해석 올립니다
(4)
띠우
|
2016.01.18
|
조회 543
|
띠우 | 2016.01.18 | 543 |
| 597 |
<해석>4장 39절
인디언
|
2016.01.16
|
조회 493
|
인디언 | 2016.01.16 | 493 |
| 596 |
38절 해석 수정 종합
주자일소
|
2016.01.12
|
조회 250
|
주자일소 | 2016.01.12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