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 세 번째 시간 후기(아인슈타인은 과연 양자역학에 깽판만 쳤는가?)
이스텔라
2022-05-31 13:34
243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실 될테니 얼른 후기 숙제 마치렵니다. 여울아님, 재하님, 아렘님, 경희님,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오붓하게 모였습니다.
사실 이번 챕터는 좀처럼 감질나게 미루며 안알려주던 ‘배타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드디어 미스테리의 베일을 벗는 대목이라 모두들 기대가 컸으나, 상차림으로 마련된 이야기 거리는 우리가 기대하던 메뉴와는 각자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지난 번 쓴 거 copy & paste 주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울리의 배타원리에 대한 설명을 막상 듣고 나니 뭔가 콜럼버스 달걀 같은 느낌도 들고, 남이 열심히 연구해 놓은 숫자 들여다보고 머리만 쨍하게 굴린 파울리가 어딘가 베짱이처럼 느껴져서 처음엔 약간 허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배타원리란 것도 숫자 자체의 규칙만 놓고보면 요새 좀 똑똑한 중고딩 정도면 쉽게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쨔잔~~~ 2, 8, 18, 32…
이 수열의 비밀은?
나름의 숫자 감각을 지닌 분들은 어렵지 않게 눈치 채셨을 겁니다. 수열 전체를 2로 묶고 나면 자연수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라는 것을!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미 눈치 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울리의 착한 스승인 조머펠트가 자신이 집필한 책 한 권을 게으름뱅이 제자 파울리에게 보냈는데, 아마도 대충 뒤적거려만 봤을 파울리의 레이다에 문득 서문의 내용 한 가지가 걸려들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캐번디시 연구소 소속 에드먼드 스토너라는 영국인이 빡세게 연구해 놓은 논문의 결론을 훑어보며, 앞서 문제를 낸 전자껍질 속 전자들의 수열인 2, 8, 18, 32…에 담긴 ‘2가의 값(two valuedness)’에 주목하면 뭔가 새로운 insight가 생길 것 같다는 번개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 떠먹으며, 타고난 천재적 머리를 굴리던 파울리는 마침내 번득이는 아이디어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이 ‘2’라는 값을 전자의 외부적인 특성으로 돌리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전자가 본래 갖고 있는 내재적 특성으로 돌려치기를 한 것입니다. 이 2라는 숫자의 묶음은 본래부터 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나오는 양이라고. 그리고 그 2라는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4번째 양자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양자수는 갖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스핀’이라는 물리적인 해석을 부여받습니다. 처음에 이 네 번째 양자수의 기이한 특성을 기술(description) 하기 위해 ‘스핀’이란 개념을 제안했던 실험물리학자 울렌벡과 호우트스미트는 단순히 지구의 자전과 비슷한 의미에서 전자의 자전 개념으로 ‘스핀’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파울리나 양자역학의 대부 보어조차도 처음에는 전자의 자전 개념이 촌스럽다고(?) 여겨서 내키지 않아했습니다. 마치 전자가 실제로 위치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처럼 묘사되는 듯한 ‘자전’ 개념이 불러 일으킬 오해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때 아인슈타인이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보어에게 원자구조 내부에서 전자가 충분히 각운동량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들어 물리법칙적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 쯤에서 아인슈타인이 정말로 양자역학을 내내 반대만 했던 인물인가에 대해 지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양자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지분을 논해 보자면 우선 빛의 이중성, 상대성 이론 등의 굵직한 개념적 바탕을 제공함으로써 양자역학이 태동하게 된 산파 역할을 했다는 점부터 거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양자역학의 발전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면 전자를 파동으로 보면 왜 안되냐고 당돌하게 주장하는 드브로이라는 듣보잡 물리학자의 논문의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동안 온전히 가정으로서만 존재하던 보어의 ‘전자의 정상상태’라는 개념에 드디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고, 앞서 스핀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둘러싸고 옥신각신 하던 순간 보어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해서 ‘스핀’교를 믿는 신도로 개종시킨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자역학의 강력한 실험적 증거로 제시되던 슈테른-게를라흐 실험이 돈없어 쩔쩔맬 때 펀딩에 크게 도움을 주었고, 조머펠트 등 여러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 이론의 불완전성을 보완해 나갈때마다 해당 수식에 상대성 이론 효과를 고려해서 해답을 찾아낸 사례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반대한 시간은 짧았으나 결과적으로 반대자 이미지가 영원히 낙인 찍혔을 뿐, 사실 그는 끊임없는 양자역학의 조력자이자 훌륭한 비판자로서 양자역학이 잘 달리도록 채찍질해 준 공로도 적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의견들을 피력하신 걸 보니 아마도 이 책의 노림수 중 하나가 바로 양자역학에서의 아인슈타인의 지분 복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어쨌건 스핀이라는 개념의 탄생과정, 슈뢰딩거 방정식, 다시 이 둘의 결합을 통한 한 편의 드라마가 무척 흥미롭네요. 그동안 입자물리학에서 렙톤과 쿼크의 기술에 등장하는 스핀이라는 요상한 물리량이 좀 낯설었는데, 물리학자들 역시 이 개념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많이들 낯가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 스핀이라는 물리량이 참 신비롭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뒤얽힘에 속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차원 속에서는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물리량은 사실 우리가 사는 차원에서는 상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그림자(projection)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수학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이 물리량이 각운동량과 같은 차원에 속해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각운동량이 스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스핀’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
이 책을 보며 새로웠던 또 한 가지 부분은 그토록 뛰어난 천재성을 지녔던 로렌츠,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보어 모두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꿰뚫는 통찰력으로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우리와 똑같이 더듬거리고, 실수하고, 심지어 수학적 실수를 해가면서 곧잘 모두가 함께 속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하긴 한 사람의 이해의 폭이 시대의 제약을 넘어 모든 걸 포괄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가 될테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천재성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인식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용기가 났습니다. 평범한 나같은 사람 역시 이렇듯 점진적이고 협동적인 단계를 거쳐 진리에 도달해 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아무튼 이제 한 1/5쯤 남겨둔 시점에서 그동안 미리 뿌려둔 떡밥을 다 회수해 버려서 앞으로 무슨 얘길 하려나 싶었는데, 이야기의 쫄깃함을 아는 저자라서인지 곧이어 새로운 대형 떡밥을 투척해 주시더군요.
"물리적 ‘같음’의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또 결국은 스핀 이야기일테니 대충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은 가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이야기에 또 기대를 모아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359 |
자연 선택설의 난점
(2)
효주
|
2024.04.19
|
조회 52
|
효주 | 2024.04.19 | 52 |
| 358 |
어중간하면 자연선택에 불리하다고요?!
(1)
곰곰
|
2024.04.16
|
조회 49
|
곰곰 | 2024.04.16 | 49 |
| 357 |
다윈의 생존투쟁은 만인의 투쟁이 아니다
(2)
두루미
|
2024.04.06
|
조회 70
|
두루미 | 2024.04.06 | 70 |
| 356 |
4월 5일(금) <종의 기원>을 3장까지 읽습니다~
(2)
두루미
|
2024.03.28
|
조회 199
|
두루미 | 2024.03.28 | 199 |
| 355 |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세 번째 후기
(4)
이소영
|
2024.03.06
|
조회 93
|
이소영 | 2024.03.06 | 93 |
| 354 |
[2024 과학세미나] 시즌1 – From so simple a beginning
(2)
두루미
|
2024.03.01
|
조회 625
|
두루미 | 2024.03.01 | 625 |
| 353 |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 두번째 후기
(2)
곰곰
|
2024.02.26
|
조회 110
|
곰곰 | 2024.02.26 | 110 |
| 352 |
<나는 어쩌다 명왕성을 죽였나>첫번째 후기-웬수 같은 달
(2)
두루미
|
2024.02.14
|
조회 180
|
두루미 | 2024.02.14 | 180 |
| 351 |
<코스모스>다섯번 째 후기 -
(2)
바다
|
2024.02.13
|
조회 140
|
바다 | 2024.02.13 | 140 |
| 350 |
달 보러 가실래요?
(18)
두루미
|
2024.02.13
|
조회 515
|
두루미 | 2024.02.13 | 515 |
| 349 |
<코스모스>네번째 후기 - 우리는 별에서 왔다
(1)
두루미
|
2024.01.31
|
조회 149
|
두루미 | 2024.01.31 | 149 |
| 348 |
<코스모스> 세 번째 시간 후기
(3)
이소영
|
2024.01.30
|
조회 181
|
이소영 | 2024.01.30 | 1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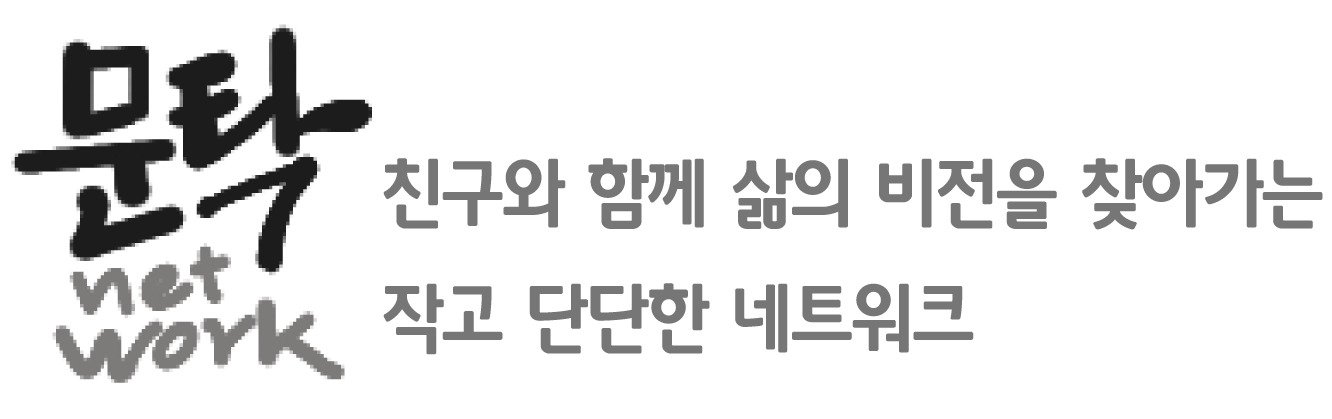
우와~ 이스텔라님이 읽어주는 원자이야기 재미있습니다!! 스핀교 만드셔도 되겠어요^^
저 높으신 차원에서 몸소 우리게 보이시려 육화되신 ‘스핀’님의 전자 안에 임재하심을 믿슙니다!!!^^
빛의 속도로 써내려간 후기 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나마 읽은 내용마저 다 까먹어 헤멨는데,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뭐..곧 도루 잊을테지만...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글로 적어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인체의 신비(?)가 놀랍기만 합니다. 예전에 직접 적은 제 글을 보고도 뭔말인지 한참 들여다 봐야할 때면 내가 그 글을 쓸 때는 에너지 준위가 꽤 높았던가보다 하고 웃어 넘기다가도 살짝 눈물 닦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