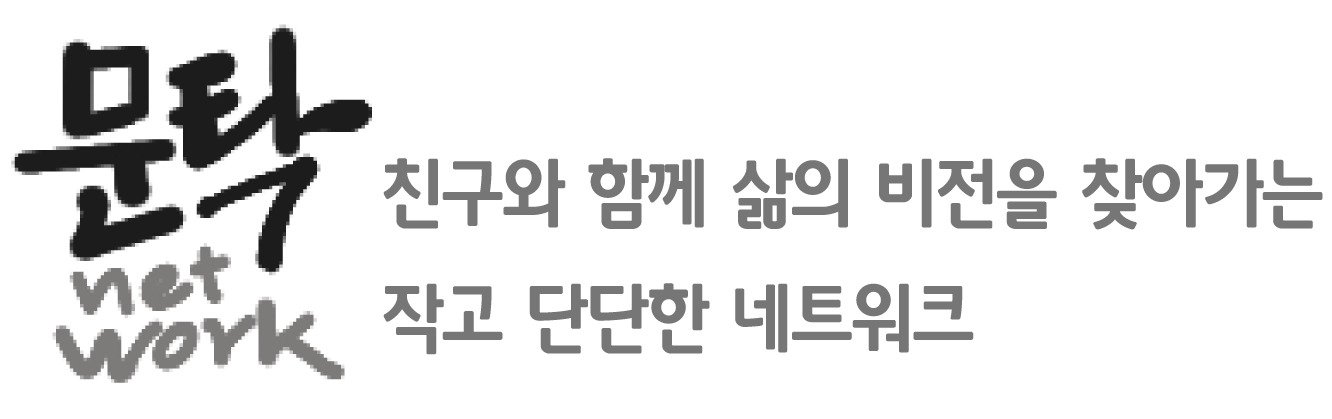[플라톤이 돌아왔다 6회] 그들만이 사는 세상, SKY캐슬과 '사당동 더하기 25'
새털
2018-12-29 18:34
584
[플라톤이 돌아왔다 6회]
그들만이 사는 세상, SKY캐슬과 '사당동 더하기 25'
-『국가』 4권
문탁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지 어느새 9년째다. 시간은 정말 자~알 간다. 정신없이 후딱 지나갔다
세미나에서 오고간 말들을 모아서 ‘10주년 자축이벤트’를 준비중이다. 거기엔 분명 당신의 생각도
단팥빵의 앙꼬처럼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연재를 통해 확인해보시라

글 : 새 털
문탁샘도 아닌데 문탁에 왔더니 ‘쪼는’ 인간으로 살고 있다
요즘 먹고 사는 시름에 젖어 ‘쪼는 각’이 좀 둔탁해졌다
예리해져서 돌아갈 그날을 꿈꾸며 옥수수수염차를 장복하고 있다
1. 플라톤의 플레이리스트 NO.1 트와이스의 ‘YES or YES’
네 마음을 몰라 준비봤어
하나만 선택해 어서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나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 맘
(트와이스의 ‘YES or YES' 가사 일부)
지난 글에서는 플라톤의 시대와 혹은 소크라테스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개인과 국가의 감각’이 다르다는 점을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갔다. 그럼 2,500년 전의 사람들과 우리의 감각은 어떻게 다른지 그 디테일한 차이를 확인해보자. 오늘날 우리가 개인과 국가 가운데 무엇을 우위에 두어야 할까 선택을 고민한다면, 플라톤에게 이런 고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니 플라톤에게는 ‘개인 or 국가’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다. 이건 마치 트와이스의 ‘YES or YES’와 같은 논리이다. 물론 트와이스가 우리에게 ‘YES or YES?’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0.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YES’를 선택할 것이다(이렇게 매력적인 아이돌의 러브콜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 맘.” 연애에서 형용모순으로 가득 찬 가사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댈 만큼 널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날 사랑해야 해’라는 고백에 내포된 역설은 형식상으로만 비논리일 뿐, 내용상으로는 전혀 비논리가 아니다. 연애는 이런 비논리적인 일방통행으로 시작된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방통행의 논리’가 발견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4권 420b)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생산자들에게는 소유가 허용되지만, 통치자집단인 수호자들에게는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식에게 남겨줄 수 없는 수호자들은 이상국가의 ‘파수꾼’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렇게 수호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이상국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윤리적인 국가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의 칼 포퍼를 위시해, 공사(公私)의 구분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에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전체주의의 ‘망령’이 느껴지는 ‘불의(不義)’로 다가온다.
우리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희생을 플라톤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통치’라고 말한다. 각자 자신의 역량을 단련하는 개인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국가가 없다는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단련시킬 장소를 갖지 못한다. 국가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단련시킬 수 있고, 자기 통치할 수 있는 개인들의 역량이 곧 국가의 역량이 된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개인 or 국가’의 선택은 상상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개인은 국가 안에서 성장하고 국가는 개인 없이 존립할 수 없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라는 명제의 핵심내용이다. 국가와 개인은 전체와 부분의 포함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조건 지어주는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인들에게는 상식과 같은 통념이었다. 고대인들에게 상식이었던 것이 2500년 경과한 뒤의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이거나 평범하지 않은 사고방식처럼 느껴진다.
인간은 폴리스 안에서 폴리스적 동물이 된다.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에서 열린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자처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이나 추방형을 권고할 때, 소크라테스는 어떤 타협도 없이 사형을 고집했다. 칠십에 가까운 노년의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이 나고 자란 아테네를 떠나 외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사람’ ‘스파르타사람’ ‘코린토스사람’과 같은 분류는 단지 지리적 위치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해 생활양식 전체를 고려한 구별이었다.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의 장군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제국의 ‘불멸의 부대’와 맞서 싸우다 전사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그는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짧고 굵게 ‘스파르타’를 외치고 죽음을 맞는다. 레오니다스에게 ‘스파르타’는 그가 사랑한 모든 것들의 ‘총합’이었다.
‘탈조선’을 외치며 시급이라도 많이 주는 외국으로 ‘워킹할리데이’를 떠나려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고대인들의 ‘폴리스-국가-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폴리스(국가와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폴리스적 동물’, 곧 어떻게 ‘정치적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준칙처럼 느껴지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우리 시대의 정치라 말해야 할까? <span styl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