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넘어 '시'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영화 인문학 후기
Micales
2020-11-08 02:04
2631
대부분의 예술들은 각자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들을-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 문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미술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다만 추측만을 할 뿐(만약 이들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 즉시 관련 학계에 알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이다.
그와 반면 '영화'라는 예술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비교적 (매우) 분명하다. 비교적, 그리고 사실상 근대에 와서 발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예술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술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하다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춘기 때에 자신이 어떤가(a.k.a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은 묻지 않는가?(나만 그런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여부를 떠나서, 아마 그러한 산물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종교일 것이다.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들을 잠시 떠나서, 종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든다. 또한 여러 종교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인간의 불멸성(이를테면 '천국'과 같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여러 사후세계와 '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초월적인 존재를 조명한다는 점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든다.
중세시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과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는 인간이 자신에게 묻는 것으로, 나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신에게 묻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묻는 행위로 인간적인 어떤 것이지만 그 자신-인간-은 모르는 내면의 본성에 관련한 물음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종교는 인간의-어떤 면에서는-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조금 길었던 머릿말을 뒤로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이번 '종교와 영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영화 인문학 내 사람들이 난색(?)을 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종교를 다루었던 여러 영화들에 대해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이야기들은 많았다.
이창동 감독이 감독한 영화, <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류의 영화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싫어한다. 예전에-아마 몇년 전 쯤이었을 것이다-엄마와 함께 영화관을 간 적이 있었다. 나는 엄마가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시길래 당연히 신나하며 무슨 영화를 볼지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대 가서 본 영화가 바로 <살아남은 아이>다. 당시 거의 처음으로 본 '그러한 류'의 영화는 나에게 불편함과 찝찝함-'아 진짜 이게 뭐야!'-그리고 기나긴 특유의 여운을 남겼었다.
그 뒤로였는지 모르겠다. '독립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이미지가 나에게 생겼는지. 그 후로부터 나에게 독립영화는 '난해하고, 심란하며, 무겁고-특유의 '다크함'-,영화 자신이 우울하기 모자라 그것을 보는 사람마저 우울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짧게 말해서 보러가는 것이 '불편'해졌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더 이상 겪기가 싫었다. 어쩌면, 회피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려나. 내가 '영화', 하면 당시-지금도 어느정도는-떠올렸었던 그 즐거움들과 상상의 나래, 오락성을 떠올리는 것과 달리 나에게는 그-<살아남은 아이>-가 처음으로 '영화적인 사유', 그러니까 기쁨, 슬픔, 그리고 감동이라는 서사적 구조에서의 사유를 탈피하고 나와 영화 자체가 삶과 어울려, 결합되어 삶과의, 그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삶과의 '쓴 맛'과 함께 맞물려 영화가 던지는 메세지를 표면 위에 떠올렸던 작품이었다.
나는 영화를 현실의 도피처로 은연중에 삼았던 것 같다. 현실의 '일상'과 그 '작음'을 피해서 스케일이 '크고', '환상'적이며, 오로지 지금의 나를 '잊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영화는, 아니었다. 현실의 자질구래함이 잊혀지기는 커녕 계속해서 스크린 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싫었다. '찌질해서'.
하지만 <실이남은 아이>에 이어서 보게된 이 영화, 이창동의 <시>는 같은 맥락 위에 서 있지만 나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영화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서 있는 위치, 즉 말하자면 그것을 보는 내가 서 있는 위치, '시간'의 선상이 달려져서 아닐까, 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여전히 독립영화를 떠올리면 삶의 '찌질함'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조금은) 든다. 그리고 그 찌질한 쓴 맛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여전하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쓴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커피가 '쓴'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즐기는 이유일까. 그 '씀'이 음미된다, 이제는.
이창동의<시>는 (지용샘의 말마따나) '불편한' 영화다. 그런데 그 불편함들의 맥락 속에서 나는 그 내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과정들을 보게된다. 단순히 '씀'이라는 단어로써 요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씀'의 형태를 보게된다. 장장 2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내리 지켜보다보면,(심지어 삽입곡-즉 분위기를 조성하며 감정을 도취 속으로 빠져들게하는 요소-도 하나 없으며, 그저 '현실'의, 일상의 소리만을 들려준다!!) 나도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 심연 속의 나를 '느낀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냥, '느낀다', 그 '쓴 맛'을 말이다.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엄마-나를 영화관에 데려간 장본인-는 나에게 말을 던졌다. '니가 이제야 영화를 좀 볼 줄 알게 됬네'.
영화 안에서 '미자'는 몸부림을 친다. 손자를 챙기고, 가정부 일을 하며, 집안은 늘 어질러져있다. 그렇게 삶이라는 것에 '찌들어있던' 그녀는 자신의 손주가 학교에서 자살한 한 여학생을 성폭행했음을 알게된다. 처음에 그녀는 태연하리만치, 아니면 혹 다른 곳에 신경을 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인지는 몰라도, '반응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물들은 감정이 마치 메말라 어딘가에 붙어버린, '말라비틀어진' 찌꺼기마냥 취급한다. 가해자의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돈으로 묻는데 여념이 없고, 아이들은 정작 상황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미자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시'를 쓰기 시작한 어느날, 시를 쓰기 위해 고민하던 그녀는 '폭발'한다. 그녀는 손자에게 가 메마른 팔뚝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손자를 붙들며 흔들면서 말한다. 왜, 도대체 왜 그랬었냐고. 그것이 그녀의 거의 유일한 '감정'이다. 일상화되버린 그녀의 메마른 삶 앞에서, 그리고 일상화되버린 폭력과 묻기의 반복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메말라'간다.
어쩌면 이 영화는 '일상'에 관한 영화일지도 모른다. '시'를 쓰기 위해서도, '이중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도, 모두 '일상의 관찰'이 필요하다.
시를 쓰지 못하는 미자에게 시인은 말한다. 주변에서 시상을 찾아보라고. 이어서 미자 시상은 어디에서 찾는 것이냐고 묻자, 시인은 당황하며 말한다. 시상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 앞에 가서 싹싹 빌며 시상아 와달라, 고 사정해야 한다고 말이다. 일상의 규범화되어버린, 메마른 폭력 앞에서도 우리들은 그 작지만 '집 안 부엌 싱크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을 자세히, 그리고 꾸준히 들여다봐야한다. 그리고 찾아가야한다. 그들이 손내미는 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손을 내밀어야한다.
그 '손'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결국 '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결국 '시상'과 '사람'은 같은 말이다. 미자의 마지막 시 속에서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자는 결국 미자에서 희진-자살한 여자아이-로 바뀐다. '그녀들'의 시, 혹은 노래 속에서 그들은 현존한다. 미자의 '시'는 결국 아녜스-여자아이의 세례명-의 '노래'이다. 왜 그녀-미자-는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아녜스에게 몰입하기 시작했을까.
(......)
그나저나 나는 왜 이렇게 딴 길로 샛지? 후기를 쓴답시고 내이야기만 한창 늘어놓은 것 같다. 얼마나 썼는지 모를 정도로....이게 에세인지, 후기인지. 수업내용은 어디에 들어간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것까지 쓰자니...쓰읍.
......아무튼, '쓰다', 이 영화. 정말 쓰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29 |
<2024 영화인문학 시즌1> 내.신.평.가.#2 <잠수종과 나비>
(4)
청량리
|
2024.04.16
|
조회 46
|
청량리 | 2024.04.16 | 46 |
| 128 |
<2024영화인문학 시즌1> 내.신.평.가 #1 피아니스트
(5)
호면
|
2024.04.11
|
조회 42
|
호면 | 2024.04.11 | 42 |
| 127 |
2024 CDP 영화인문학 시즌1_두 번째 시간 후기
(4)
청량리
|
2024.04.08
|
조회 54
|
청량리 | 2024.04.08 | 54 |
| 126 |
2024 CDP 영화인문학 시즌1_<카프카, 유대인, 몸> 메모
(4)
모카
|
2024.04.04
|
조회 55
|
모카 | 2024.04.04 | 55 |
| 125 |
2024 CDP 영화인문학 시즌1_첫 시간 후기
(2)
띠우
|
2024.03.31
|
조회 71
|
띠우 | 2024.03.31 | 71 |
| 124 |
2024 CDP 영화인문학 시즌1_첫 시간 공지~
(4)
청량리
|
2024.03.23
|
조회 103
|
청량리 | 2024.03.23 | 103 |
| 123 |
2024 CDP 영화인문학 시즌1 <영화로운 신체들> (3/29 개강)
(10)
청량리
|
2024.02.18
|
조회 576
|
청량리 | 2024.02.18 | 576 |
| 122 |
<2023영화인문학> 에세이데이 후기입니다
(5)
띠우
|
2023.12.13
|
조회 220
|
띠우 | 2023.12.13 | 220 |
| 121 |
2023 영화인문학 마무리에세이 올려주세요
(5)
띠우
|
2023.12.07
|
조회 210
|
띠우 | 2023.12.07 | 210 |
| 120 |
2023 영화인문학 <영화, 묻고 답하다> "에세이데이"에 초대합니다
(2)
청량리
|
2023.12.04
|
조회 294
|
청량리 | 2023.12.04 | 294 |
| 119 |
<2023 영화인문학> 내.신.평.가.#8 <말없는 소녀>
(5)
청량리
|
2023.11.23
|
조회 154
|
청량리 | 2023.11.23 | 154 |
| 118 |
<2023 영화인문학> 내.신.평.가.#7 <파고>
(5)
청량리
|
2023.11.16
|
조회 149
|
청량리 | 2023.11.16 | 1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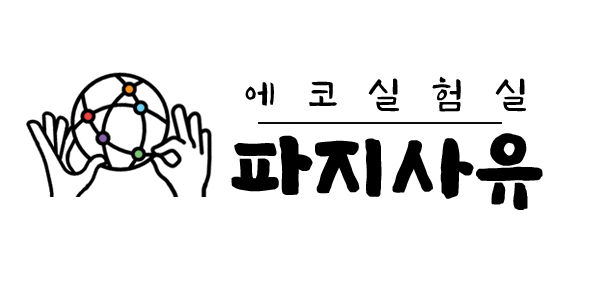
재하, 멋지군요.
저도 이 영화, <시> 참 좋아해유
저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였네요
재하군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하는게
느껴지는 후기군요.
내게 재하군은 세미나 친구이면서
귀염둥이이기도 하다는점.
알고 있나요?
본인이 거부해도 나는 그렇게 인식한다우~
요즘 부쩍 '방실방실' 잘~웃어서 더 그렇답니다.
후기 잘 읽었어요.
오홋! 잘 읽었어요~같이 영화보고 이야기나누고 후기로 만나는 재미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흠
재하가 ‘쓴 !!’ 영화 <시>의 후기를 쓰느라 아무튼의 후기를 잊은듯하구먼 ㅋㅋ
며칠 전 저도 이 영화보고서 한참동안 많은생각이 떠다녔지요~ 시상이 찾아오길 바라는 맘! 그 간절함...에서 얻어지는 삶이 가슴에 찡!! 하게 남더군요
후기 덕분에 그 맘이 다시 생각나네요~ 잘읽었습니다
ㅎㅎ 늦게나마 <아무튼>후기도 썼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후기에 나온 영화 얘기를 보면 아마 같이 안보면 안 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치는 영화는 보지를 못하겠어요. 후기로나마 불편한 영화를 잘 보았습니다. 🙂
요즘 들어 영화인문학을 통해
재하군의 공부가 하나로 뭉쳐졌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걸 보는 느낌ㅎㅎㅎ
재하군이 마치 한편의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은^^
화이팅!!!